대학교 1~2학년 때 플레이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었다. 드리블 돌파와 몸싸움을 즐겼다. 레이업이 장기였고 포스트에서 두 세 명이 둘러싸도 뚫고 골을 넣었다. 코트에서 별명은 탱크, 맥도웰, 바클리. 농구 잘 한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나와 부딫힌 사람은 기분이 상했고 패스를 받지 못한 팀원은 재미없어했다. '패스 좀 해라. 패스 너무 안 한다. 그런데 잘 하니까 할 말은 없네.' 같은 말도 들었다. 그런데 나의 공격은 정말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철저하게 막혔다.
한참을 지나서 느꼈다. 포스트에서 세 명이 나를 둘러싸면 우리 팀 나머지 두 명이 프리가 된다는 것을! 그 때부터 패스를 했다. 전에는 골대만 보였다면 이제는 경기장 전체가 보이기 시작했다. 드리블은 단지 단독 돌파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보다 여유롭게 볼을 소유하며 확실한 패스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도 깨달았다.
패스를 즐겨하고 많이 이겼는지는 안 해아려봐서 모르지만, 패스를 주로 하면서 게임을 더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전에는 실력이 월등한 사람을 만나면 내 돌파는 여지없이 막혔다. 하지만 패스를 하다가 가끔 한 번씩 돌파를 하면 먹혀들었다. 이제 과격한 몸싸움도 그리 즐겨하지 않게 되었다. 바스켓 맨으로서 성숙한 것이다.
하지만 초창기 에고이스트 플레이가 없었다면 성숙하지 못했을 것이다. 드리블 돌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앞에 수비가 있어도 여유있게 경기장을 살필 수 있다. 상대는 내가 직접 공격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패스는 상대의 허를 찌를 수 있다. 또 몸싸움이 되기 때문에 수비와 리바운드 자리 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결정적 순간에 내가 직접 공격할 수도 있다.
에고란 일종의 '난 이런 플레이를 하는 사람이다' 혹은 '내 플레이는 이렇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선언. 일단 에고이스트가 되어야 한다.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고가 되어봐야 한다. 성숙은 그 다음. 에고이스트 과정이 생략된 성숙은 성숙이 아니라 그냥 적응. 성숙하기 이전에 나 자신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것을 해 봐야 한다.
물론 에고이스트적 성향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에고이스트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흔히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하는 '곤조(자기 성향에 대한 쓸데 없는 집착이나 자존심)'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성장을 위해서는 곤조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 잘 익은 벼일 수록 고개를 숙인다지만, 아직 익지도 않은 벼에게 고개부터 숙이라 한다면 그 벼는 충분히 익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충분히 익고 여물었음데도 여전히 꼿꼿이 서 있으면 이 또한 상품 가치가 없다.
아집은 거푸집과 같다. 작품을 완성하려면 거푸집이 필요하지만 거푸집이 작품은 아니다. 계속 거푸집만 갈고 닦으면 진짜 작품을 만날 수 없다. 에고이스트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실력을 먼저 키울 필요가 있지만, 실력이 어느 정도 경지에 도달하면 실력과 더불어 인격을 보유해야 더 높은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자기만의 스타일을 탐색하고 찾아가는 것이 자아 발견의 시작이라면, 이러한 과정 속에서 생긴 쓸데없는 곤조를 제거하고 진정한 가치관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성숙.
그런데 정말 이 나라에는 에고를 일찌감치 접고 적응부터 한 녀석들이 넘쳐난다. 우리 사회는 에고를 표출하는 사람은 잘난척 한다고 덮어놓고 싫어하니까. 그만큼 충분히 성숙한 사람도 드물다. 어쩌다 강한 에고를 가지게 된 녀석은 스스로에게 지나친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듯 하다. 주변을 둘러보면 일치감치 에고를 잃은 녀석들 투성이니 그럴만도 하지 않은가.
물론 에고이스트적 성향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에고이스트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흔히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하는 '곤조(자기 성향에 대한 쓸데 없는 집착이나 자존심)'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성장을 위해서는 곤조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 잘 익은 벼일 수록 고개를 숙인다지만, 아직 익지도 않은 벼에게 고개부터 숙이라 한다면 그 벼는 충분히 익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충분히 익고 여물었음데도 여전히 꼿꼿이 서 있으면 이 또한 상품 가치가 없다.
아집은 거푸집과 같다. 작품을 완성하려면 거푸집이 필요하지만 거푸집이 작품은 아니다. 계속 거푸집만 갈고 닦으면 진짜 작품을 만날 수 없다. 에고이스트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실력을 먼저 키울 필요가 있지만, 실력이 어느 정도 경지에 도달하면 실력과 더불어 인격을 보유해야 더 높은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자기만의 스타일을 탐색하고 찾아가는 것이 자아 발견의 시작이라면, 이러한 과정 속에서 생긴 쓸데없는 곤조를 제거하고 진정한 가치관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성숙.
그런데 정말 이 나라에는 에고를 일찌감치 접고 적응부터 한 녀석들이 넘쳐난다. 우리 사회는 에고를 표출하는 사람은 잘난척 한다고 덮어놓고 싫어하니까. 그만큼 충분히 성숙한 사람도 드물다. 어쩌다 강한 에고를 가지게 된 녀석은 스스로에게 지나친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듯 하다. 주변을 둘러보면 일치감치 에고를 잃은 녀석들 투성이니 그럴만도 하지 않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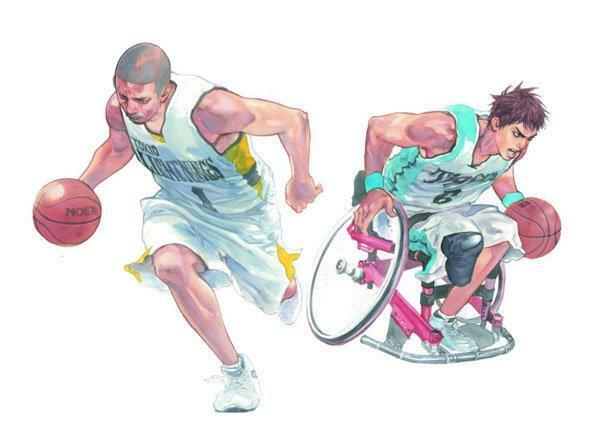
댓글 없음:
댓글 쓰기